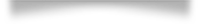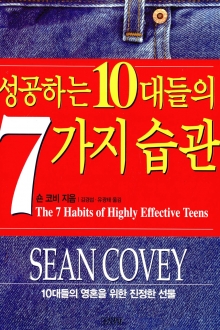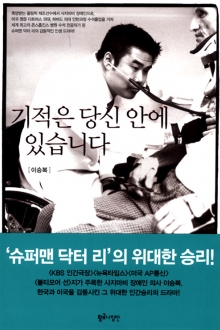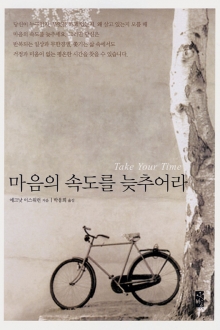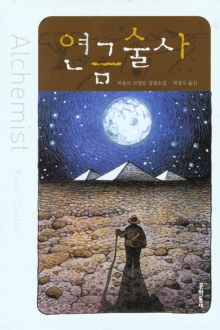전라도와 경상도사이의 경계선 따라 흐르는 섬진강 옆에 화개장터가 있다. 그곳엔 장날이 아니어도 사람들이 북적댄다. 화개장터엔 옥화의 주막이 가장 이름난 주막이었다. 술맛이 좋아서인지, 성기라는 아들놈과 사는 옥화를 동정해서인지는 모르나, 노자가 부족하거나 행장이 불비할 땐 의례 옥화네 주막에 신세를 지곤 하였다. 옥화는 아들 성기의 역마살을 없애기 위해서 쌍계사에서 생활토록하고, 장날에만 책을 팔도록 한다. 어느날 옥화 어미와 하룻밤을 보내어 옥화를 낳았던 체장수영감이 40년 만에 어린 ‘계연’이라는 딸을 데리고 옥화에게 사정을 말해 잠시 생활을 부탁하고 장삿길을 떠난다. 옥화는 계연을 성기와 엮어 성기의 역마살을 없애보려고 가까워질 수 있게, 계연에게 성기의 시중을 들게한다. 그러던 어느 날 옥화는 계연에게서 자신과 같이 귓바퀴에 난 사마귀를 보고, 자신의 동생일 수 있다는 예감에 성기와 계연의 사이가 가까워지지 않도록 신경을 쓴다. 체장수가 돌아와 이야기를 듣고, 옥화는 계연이 자신의 이복동생임을 알게 된다. 성기와 계연은 이루어질 수 없는 인연이기에 체장수는 계연을 데리고 구례 쪽으로 돌아간다. 성기는 병을 얻게 되지만, 옥화에게 계연이 이모라는 사실을 듣고, 그는 해동 쪽을 향해 장사를 떠난다.
김동리 소설에서의 나는 그가 나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 그의 필력은 참으로 소박하면서도 부드럽고... 그리 과장스럽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구수한 맛을 낸다. 그의 소설을 읽을 때면, 잡다한 생각이 사라지고 교훈적 비판적인 요소를 찾을 모티브마저 잃어버린다. 단지 그가 말해주는 그 구수한 이야기에 미소를 지을 뿐이다. 그리고 “세상에 그런 일도 있군...”하는 동의조의 말을 내 입 밖으로 뱉도록 한다. 그렇게 만드는 그의 능력이 부럽다. 프랑스의 ‘베르나르 베르베르’도 역시 나에게 그런 느낌을 갖게 한다.
운명에 대한 순응... 옥화의 아버지인 체장수에게서 나온 역마살이 옥화와 하루밤을 보내어 성기를 낳은 스님을 거처, 결국 성기가 엿판을 들고 길을 떠나도록 하는 운명이라는, 그 것! 그것이 비극적 운명인지 인간적 숙명인지 모를 그 운명... ‘역마’는 운명 앞에서 당당해질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작품이었다. 물론, 김동리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인간의 나약함은 아니었을지라도, 내가 느낀 건 결국 운명의 논리에 무릎 꿇는 인간의 나약함이었다.
성기가 지닌 ‘역마살’이 없애려 해도 없어질 수 없다는 것이 운명이었다면... 운명에 운명이 겹쳐진 ‘설상가상’이 아닌가? 웃기는 부분이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해학을 느낀다면 내가 이상한 걸까? 결국은 운명에 운명이 가세하고 있으니, 이미 역마살이 발동할 일은 시간 문제였을 뿐이 아닌가? 그 역마살 발동 시점 전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은, 그저 있으나 없으나 하는 허무맹랑한 의미 없는 일들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차피 해체가 불가능한 폭탄을 찾아서 해체를 시도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결국 터질 것이 뻔한 일기에 하나마나한 일이 되는 것처럼.
나는 내 삶에 있어서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그러고 싶지 않다. 운명은 단지 내가 딛고 있는 땅의 굴곡이고, 강물의 본래 흐름이고, 식생의 분포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곡괭이로 긁든지 삽으로 파든지 하면, 땅의 굴곡도 내 뜻대로, 물길도 내 뜻대로, 식물의 분포도 내 뜻대로 바꿀 수 있게 된다는 참으로 간단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더 큰 운명이 그것을 방해 할 수도 있다.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태풍, 번개, 홍수, 가뭄 등... 그렇다고 나도 방법이 없을까? 댐, 저수지 등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그러한 운명에 반항을 하면서 운명의 힘을 상쇄시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운명도 내가 온갖 수작을 부리며 내가 바라는 대로 길을 내려고 하면 신물이 날 것이다.
얼마든지 운명을 이용해서 내 삶을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운명을 숙명으로 여기기보다는 내가 개척해볼만한 멋진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몫이라고 생각한다면, 재미있게 가꾸어볼만한 것이 아닐까 싶다. 아직 내가 더 큰 운명의 힘을 만나보지 못해서 그런가? 나는 아직까진 운명을 따르기 보다는, 개척을 시도해서 꾸미는 일이 더 쉬운 것 같다.
***** 서호건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9-08-08 16:00)
김동리 소설에서의 나는 그가 나에게 직접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을 갖는다. 그의 필력은 참으로 소박하면서도 부드럽고... 그리 과장스럽지도 화려하지도 않지만, 구수한 맛을 낸다. 그의 소설을 읽을 때면, 잡다한 생각이 사라지고 교훈적 비판적인 요소를 찾을 모티브마저 잃어버린다. 단지 그가 말해주는 그 구수한 이야기에 미소를 지을 뿐이다. 그리고 “세상에 그런 일도 있군...”하는 동의조의 말을 내 입 밖으로 뱉도록 한다. 그렇게 만드는 그의 능력이 부럽다. 프랑스의 ‘베르나르 베르베르’도 역시 나에게 그런 느낌을 갖게 한다.
운명에 대한 순응... 옥화의 아버지인 체장수에게서 나온 역마살이 옥화와 하루밤을 보내어 성기를 낳은 스님을 거처, 결국 성기가 엿판을 들고 길을 떠나도록 하는 운명이라는, 그 것! 그것이 비극적 운명인지 인간적 숙명인지 모를 그 운명... ‘역마’는 운명 앞에서 당당해질 수 없는 인간의 나약함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작품이었다. 물론, 김동리가 말하고자 했던 것이 인간의 나약함은 아니었을지라도, 내가 느낀 건 결국 운명의 논리에 무릎 꿇는 인간의 나약함이었다.
성기가 지닌 ‘역마살’이 없애려 해도 없어질 수 없다는 것이 운명이었다면... 운명에 운명이 겹쳐진 ‘설상가상’이 아닌가? 웃기는 부분이었다. 이러한 부분에서 해학을 느낀다면 내가 이상한 걸까? 결국은 운명에 운명이 가세하고 있으니, 이미 역마살이 발동할 일은 시간 문제였을 뿐이 아닌가? 그 역마살 발동 시점 전까지의 일련의 과정들은, 그저 있으나 없으나 하는 허무맹랑한 의미 없는 일들이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 어차피 해체가 불가능한 폭탄을 찾아서 해체를 시도하는 것은 무의미하고 결국 터질 것이 뻔한 일기에 하나마나한 일이 되는 것처럼.
나는 내 삶에 있어서 운명을 그대로 받아들이지는 않는다. 그러고 싶지 않다. 운명은 단지 내가 딛고 있는 땅의 굴곡이고, 강물의 본래 흐름이고, 식생의 분포일 뿐이라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곡괭이로 긁든지 삽으로 파든지 하면, 땅의 굴곡도 내 뜻대로, 물길도 내 뜻대로, 식물의 분포도 내 뜻대로 바꿀 수 있게 된다는 참으로 간단한 사실이 존재한다는 것이다. 물론 더 큰 운명이 그것을 방해 할 수도 있다. 내가 어찌 할 수 없는 태풍, 번개, 홍수, 가뭄 등... 그렇다고 나도 방법이 없을까? 댐, 저수지 등 나름대로 준비를 해서 그러한 운명에 반항을 하면서 운명의 힘을 상쇄시킬 수도 있지 않겠는가? 운명도 내가 온갖 수작을 부리며 내가 바라는 대로 길을 내려고 하면 신물이 날 것이다.
얼마든지 운명을 이용해서 내 삶을 더 풍요롭고,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을 말하고 싶다. 운명을 숙명으로 여기기보다는 내가 개척해볼만한 멋진 나에게 주어진 특별한 몫이라고 생각한다면, 재미있게 가꾸어볼만한 것이 아닐까 싶다. 아직 내가 더 큰 운명의 힘을 만나보지 못해서 그런가? 나는 아직까진 운명을 따르기 보다는, 개척을 시도해서 꾸미는 일이 더 쉬운 것 같다.
***** 서호건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9-08-08 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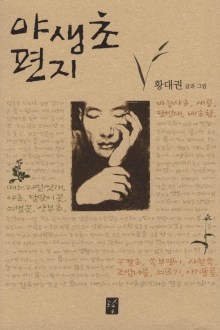 야생초 편지 - 황대권
야생초 편지 - 황대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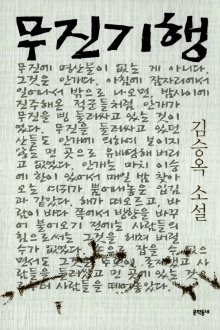 [독후감] 무진기행 - 김승옥
[독후감] 무진기행 - 김승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