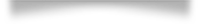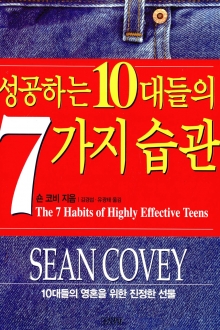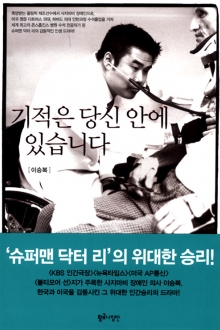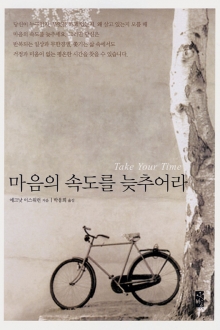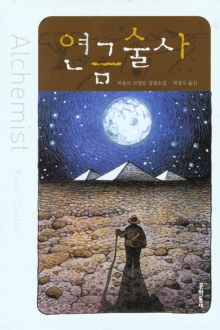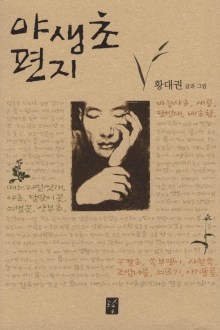소설은 영달이 밥값을 떼어먹고 도망쳐 나오다가, 고향인 삼포로 가는 정 씨를 만나면서 시작한다. 특별한 목적지가 없었던 영달은 정 씨에게 삼포가 살기 좋은 곳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정 씨를 따라 삼포로 가게 된다. 가다가 한 마을에서 국밥을 먹는 중에 ‘백화’라는 작부가 도망쳤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고, 술집주인에게서 잡아오면 만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는다. 그들은 감천으로 가는 중에 송림 사이에서 소변을 보고 있던 백화를 만난다. 당차게도 백화는 자신의 길고도 화려한 4년간의 작부 세월을 떠들었고, 그들은 그녀의 처량함 밖으로 나오는 당찬 태도에 매료되었는지 함께 길을 걷는다. 가던 길에 폐가에서 잠시 언 몸을 녹이며 백화는 영달에게 호감을 표하지만, 영달은 아무렇지도 않은 듯 다분히 백화의 이야기를 듣는다. 다시 길을 걷다가 눈길에 백화가 넘어져 다리를 다치고 영달이 그녀를 업고 간다. 감천 읍내에 도착하여 백화는 영달에게 자신의 고향엘 가면 일자리를 잡아주겠다고 한다. 그러나 영달은 차표와 빵을 사다주며 백화를 기차에 태운다. 백화는 개찰구로 나가며 영달에게 본명이 ‘이점례’라며 소리치고 기차를 탄다. 그들은 대합실에서 노인에게서 ‘삼포가 개발되고 있다’는 희비가 엇갈리는 소리를 듣게 된다. 영달은 잘된 일이라 여기지만, 마음의 정처를 잃은 정 씨는 기차가 도착하자 발걸음을 내딛기 힘들어했고, 기차는 어두운 들판을 향하고 소설의 마지막 점이 찍힌다.
무슨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 할까? 이 짧은 소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가 너무 많아져, 쉽사리 정리가 안 된다. 뇌 속의 ‘생각 체증(滯症)’이 일어난 것일까? 가장 먼저 정리된 것은 ‘소설 속의 눈에 너무 잘 띄는 우연성’이다. 영달과 정 씨가 소변보고 있는 백화를 만나게 되는 절묘하고도 신기한 전개가 그것이다. 사실 어색한 부분이 아닐 수 없지만, 작가로서는 백화라는 인물이 갖는 ‘삶의 탈피’의 이미지를 원활히 살리기 위해서는 만나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작가의 의도적인 개연성이 되는 것인가? 물론, 소설 밖의 일이기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다. 단지 결벽에 가까웠던 완벽성을 추구했다던 황석영의 소설에 이러한 눈에 띄는 우연성이 있다는 것이 조금 어색하게 느꼈다.
그리고 정리되는 것은 ‘삼포’라는 곳이다. 나에게도 ‘삼포’가 있는가? 마음속에 담가 둔 온 생각의 집결 점이인 그 곳.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대로 믿고 목표로 둔 가치 뒤에 숨어있는 내가 모르는, 내 모든 것의 집결 점의 가치를 무의미하게 해버릴 수 있는 ‘삼포의 존재성’ 말이다. 아직 나는 노인을 만나지 못했으니 기차에 오르기에 힘든 발걸음을 내딛을 걱정은 없지만, 막상 기차를 타려는 순간에 내가 몰랐던 진실을 말해버릴 노인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도 정 씨처럼 가슴에 억장을 무너뜨리는 우뢰를 맞게 될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의 변화를 충분히 감할 수 있는 내가 된다면, 그것이 결코 기차를 타려는 내 발길을 붙잡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이 소설에서 느낀 ‘삼포’이다.
물론, 당시 시대상에서의 70년대 산업화로 인한 고향으로 인한 상실감으로 그나마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마지막 여생의 희망마저 유랑으로 보내지는 아픔과 결국 동병상련의 아픔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의지하게 되는, 당시에 필요한 민중의 연대적인 의식 촉구하고자 함이 작가가 드러내고자 한 본래의 의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삼포의 상실이 그러한 단순한 상실일까? 예기치 않은 변화에 민중은 수긍하고 모두 벙어리가 되어 모두 손과 발로 서로를 어루만지기만 해야 하는가?
그 당시 민중은 오히려 서로 부둥켜안고 서로를 쓰다듬기만 하는 영원히 어둠의 들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야했다. 영달과 같은 입장이 된 정 씨가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슬픔을 끌어안고 안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어두운 들판으로 향하는 기차를 타는 것뿐이었을까? 그리고 그 기차는 왜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으로 향했던 것일까? 그럴 바에야 타지 않았어야 했었을 것을...
‘삼포’가 내가 꿈꾸던 ‘고향’과 전혀 다른 것이 되었다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면... 그러한 입장에서 나라면, 뜨내기 기술자가 되어 ‘삼포행 기차’에 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영달만 보내고, 나는 내가 꿈꾸었던 삼포 같은 곳을 찾아 나섰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삼포’가 아닌 ‘제 2의 고향’을 꿈꾸며 변화의 원단(原緞)의 패턴에 알맞은 실 가닥을 끼워가며 새로운 무늬를 수놓을 것이다. 내가 걷는 발길은 전혀 무겁지 않다. 가던 길의 방향만 바꾸는 것이니까...
***** 서호건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9-08-08 16:00)
무슨 이야기를 먼저 꺼내야 할까? 이 짧은 소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이야깃거리가 너무 많아져, 쉽사리 정리가 안 된다. 뇌 속의 ‘생각 체증(滯症)’이 일어난 것일까? 가장 먼저 정리된 것은 ‘소설 속의 눈에 너무 잘 띄는 우연성’이다. 영달과 정 씨가 소변보고 있는 백화를 만나게 되는 절묘하고도 신기한 전개가 그것이다. 사실 어색한 부분이 아닐 수 없지만, 작가로서는 백화라는 인물이 갖는 ‘삶의 탈피’의 이미지를 원활히 살리기 위해서는 만나게 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그러면 작가의 의도적인 개연성이 되는 것인가? 물론, 소설 밖의 일이기에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이다. 단지 결벽에 가까웠던 완벽성을 추구했다던 황석영의 소설에 이러한 눈에 띄는 우연성이 있다는 것이 조금 어색하게 느꼈다.
그리고 정리되는 것은 ‘삼포’라는 곳이다. 나에게도 ‘삼포’가 있는가? 마음속에 담가 둔 온 생각의 집결 점이인 그 곳. 자연스럽게 연상되는 대로 믿고 목표로 둔 가치 뒤에 숨어있는 내가 모르는, 내 모든 것의 집결 점의 가치를 무의미하게 해버릴 수 있는 ‘삼포의 존재성’ 말이다. 아직 나는 노인을 만나지 못했으니 기차에 오르기에 힘든 발걸음을 내딛을 걱정은 없지만, 막상 기차를 타려는 순간에 내가 몰랐던 진실을 말해버릴 노인을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 그리고 나도 정 씨처럼 가슴에 억장을 무너뜨리는 우뢰를 맞게 될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 순간의 변화를 충분히 감할 수 있는 내가 된다면, 그것이 결코 기차를 타려는 내 발길을 붙잡지는 못할 것이다. 그것이 내가 이 소설에서 느낀 ‘삼포’이다.
물론, 당시 시대상에서의 70년대 산업화로 인한 고향으로 인한 상실감으로 그나마 마음속에 품고 있던 마지막 여생의 희망마저 유랑으로 보내지는 아픔과 결국 동병상련의 아픔으로 서로를 이해하며 의지하게 되는, 당시에 필요한 민중의 연대적인 의식 촉구하고자 함이 작가가 드러내고자 한 본래의 의미일 수도 있다. 하지만 단순히 삼포의 상실이 그러한 단순한 상실일까? 예기치 않은 변화에 민중은 수긍하고 모두 벙어리가 되어 모두 손과 발로 서로를 어루만지기만 해야 하는가?
그 당시 민중은 오히려 서로 부둥켜안고 서로를 쓰다듬기만 하는 영원히 어둠의 들판에서 벗어날 수 없는 삶. 그러한 삶에서 벗어나야했다. 영달과 같은 입장이 된 정 씨가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슬픔을 끌어안고 안고 무거운 발걸음으로 어두운 들판으로 향하는 기차를 타는 것뿐이었을까? 그리고 그 기차는 왜 ‘눈발이 날리는 어두운 들판’으로 향했던 것일까? 그럴 바에야 타지 않았어야 했었을 것을...
‘삼포’가 내가 꿈꾸던 ‘고향’과 전혀 다른 것이 되었다면, 다시 되돌릴 수 없다면... 그러한 입장에서 나라면, 뜨내기 기술자가 되어 ‘삼포행 기차’에 오르지 않았을 것이다. 영달만 보내고, 나는 내가 꿈꾸었던 삼포 같은 곳을 찾아 나섰을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삼포’가 아닌 ‘제 2의 고향’을 꿈꾸며 변화의 원단(原緞)의 패턴에 알맞은 실 가닥을 끼워가며 새로운 무늬를 수놓을 것이다. 내가 걷는 발길은 전혀 무겁지 않다. 가던 길의 방향만 바꾸는 것이니까...
***** 서호건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9-08-08 16: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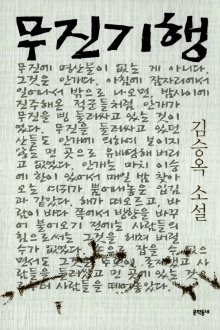 [독후감] 무진기행 - 김승옥
[독후감] 무진기행 - 김승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