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주 방황을 한 거 같다.
물론 2월 말 Fellowship 면접 직후, 그간 쌓여있단 긴장이 풀렸던 탓인지
건강상태가 갑자기 많이 나빠져서, 다른 무엇보다도 건강부터 회복해야한다는 생각으로 안정을 취하고 노력했다.
이래저래 들어본 바,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렇다는 진단을 받았던 터라...
더 더욱 나 자신에 대한 욕심을 내려놓으려고 노력했다.
그러면서도 나는 내심 내가 무슨 스트레스를 그렇게 받았단 거지?
'내가 요즘 얼마나 부지런히 알차게 재미나게 잘 지내왔는데...'하는 생각만 들었다.
물론, 내가 해온 모든 것들에 대한 내 개인적인 애착과 즐거움 또한 가득했던 것도 사실이다.
허나... 어쩌면... 나는...
그 많은 중압감 속에서...
애써 태연한 척,
아무렇지 않은 척,
잘 되가는 척,
다 버틸만 한 척,
그렇게 센 척을 하며 꾸역꾸역
나 자신이 보다 더 잘난 존재로 유능한 인재로 보여질 수 있게 혹사시켰는지도 모른다.
열심히 하는 것은 분명 좋은 것이다.
아무리 불광불급이라지만, 과유불급이기도 한 법.
뱁새가 황새 쫓다 가랭이 찢어진다고,
무엇보다 나 자신의 역량을 스스로 성찰할 필요가 있다.
내가 마치 슈퍼맨인냥 오만에 빠진 채,
온몸을 불사르며 나도 마음껏 훨훨 날아오를 수 있다는 크나큰 착각에 젖어
바보처럼 절벽 끝에서 펄쩍하고 뛰어오르는 어리석음을 범해서는 안될 일이다.
내 분수에 맞지 않는 내 역량에 과한 일은 실패하는 것이
나를 위해서도 그리고 나보다 더 그 일에 적합한 누군가를 위해서도 바람직한 것이고
그래야 남과의 비교로부터 스스로를 경멸하는 자기비하의 늪에 빠져
열등의식을 잔뜩 입고 "나 좀 인정해달라"며 세상의 관심을 부르짖으며 허우적 거리지 않을 수 있다.
마음은 싱숭생숭하고, 해야할 것도 많고 하고픈 것도 많은데...
한편으로는 다 하기 싫기도 하고...
아무것도 안하려니, 또 마음이 무겁고...
그러다가 굵직굵직한 것들을 마무리 지은 지난 주말...
이제 조금 몸과 마음이 추스려지는 것 같았다.
얼마 전 누군가의 카카오스토리에서 그런 글을 읽었다.
30대 후반 쯤의 두 자녀를 둔 젊은 엄마의 이야기였는데,
그녀가 속이 안 좋아서, 병원엘 갔는데...
암이라며, 길어야 6개월이라는 얘길 들었단다.
그래... 내 생애 남은 6개월...
그녀는 무슨 감정에 휩싸였을까?
'어쩌다가 내가 이런 몹쓸 병... 이 엿같은 세상이 나에게 고통도 모자라서 병까지 주는구나!'
이런 생각?
아니...
그녀는 그제서야 하루 하루 자신에게 주어진 시간의 소중함을 온전히 깨달았다고 했다.
매일 아침 소리치며 아이들을 깨우고, 입히고, 학교 보내고~
그 전쟁 같은 일상이... 고통이 아니라 축복이었음을...
이젠, 그렇게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 없어질 것임을...
자신이 없을 때, 이들이 어떻게 일어나 밥을 챙겨먹고 또 세상을 향해 나갈지...
그걸 지켜볼 수 없단 것이... 그 곁에 자신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 그게 얼마나 아쉬운 일인지를...
‘그대가 헛되이 보낸 오늘은 어제 죽어간 이들이 그토록 살고 싶어 하던 내일이었습니다. 순간순간 충실한 삶을 사십시요.’
원래 이 말은 외국인이 했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그 분은 못찾겠고...
이해인 수녀님께서 암투병 중에 병상에서 하셨던 말로 다시 회자되었다고 한다.
다들 너무나도 익숙히 아는 명언이다.
그런데, 좋은 글과 말은...
말 자체도 참으로 아름답지만,
그 글귀를 읽는 순간의 내 삶에 따라
그 의미가 와닿는 깊이가 달라지는 것 같다.
이번 주말 이 글귀 하나에서 나는 나 자신을 다시 되돌아보며 일으켜세웠다.
마치 올 1년이 내 생애 마지막 한 해인 것처럼,
이번 달이 내게 주어진 마지막 한 달인 것처럼,
오늘이... 나의 마지막 하루인 것처럼,
지금 이 순간 이 곳이
내가 삶의 마지막 종착역임을 늘 기억하며
뜨겁게 아름답게 멋지게 만끽하기로 마음 먹었다.
Carpe die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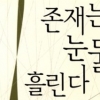 정말 오랜만에 뭉친 삼인방 그리고 봄
정말 오랜만에 뭉친 삼인방 그리고 봄
 오늘은 발렌타인 데이였어
오늘은 발렌타인 데이였어










